티스토리 뷰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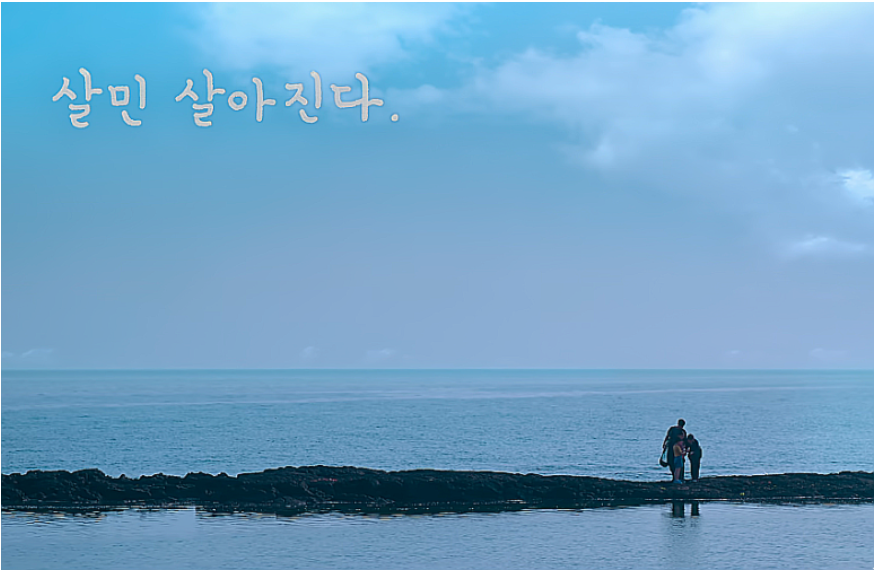
집도 있고 배도 있어 너무나 좋다던 애순은 관식, 그리고 아이들은 두 번 다시 못 올 찬란한 계절이었던 그들의 행복한 여름밤을 배 위에서 보내며 여섯 번째 에피소드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시작됩니다.
1. 줄거리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 장면과 함께 심한 태풍이 그려집니다. 동명이 밥을 먹다 말고 사탕을 먹으려 하다 떨어뜨리고 그 순간 애순은 금명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동명을 혼내다 말고 금명을 데리러 갑니다. 금명과 돌아온 애순은 은명과 동명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당황합니다. 비바람을 뚫고 해녀 이모들이 은명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 동명은 집에 없고 동명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이 뒤집힙니다.
여름의 변덕이 애순의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경자 이모의 무거운 표정과 함께 이어지는 장면은 차가운 동명의 시신을 안고 반은 넋을 잃은 애순이 길 한복판에 앉아 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쇠같이 단단하고 속으로 모든 것을 삼키던 관식이 파도를 덮을 듯한 울음을 토해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집안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애순은 동명이 안아달라고 할 때 금명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 나갔던 자신을 자책하며 숨죽여 울고 또 웁니다. 애순은 거의 기절하듯 누워 엄마 광례의 말을 기억합니다. 죽어라 발버둥을 치면 반드시 하늘이 보이고 숨통이 트인다는 광례의 말과 함께 기운을 차립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애순은 엄마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친구들과 달고나를 만드는 은명에게서 자기가 동명이를 두고 나가서 아기가 죽었다며 자책하는 말을 듣습니다. 금명은 금명대로 자기가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면 동명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며 100점 받은 시험지를 내놓지도 못하고 육성회비 봉투도 아빠에게 내놓지도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온 가족이 동명이를 잃은 슬픔에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지만 애순과 관식은 아이들의 숨죽인 울음에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엄마와 아빠, 아들까지 앗아간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애순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이 바다, 그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애순은 바다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해가 뉘엿뉘여 저물어져 가는 바닷가에서 애순은 변덕스러운 여름, 동명을 앗아간 여름에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살면 살아진다지만 그들의 여름 중간중간 찾아오는 동명을 잃은 슬픔은 눈물로 메워집니다. 동명의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던 관식은 극도의 슬픔에 주저앉고 맙니다. 애순은 금명과의 회상씬에서 관식이 내시경을 앞둔 30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그날 축대를 쌓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동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달고나를 먹고 있던 은명의 밥을 챙겨주려 하던 애순은 부엌에 들어갔다가 놀랍니다. 고구마며 고기며 생선들이 한가득입니다. 때마다 챙겨주는 이웃들이 있어서 애순이가 살 수 있었나 봅니다. 애순은 그걸 보며 또 웁니다. 유채꽃이 혼자 피지 어 살지 못하듯이 애순이 역시 주변의 숨은 도움으로 여태까지 온 것을 회상합니다. 주인집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배려가 그랬고 새아빠의 처인 민옥의 "도희정 장학금", 같이 힘든 해녀 이모들의 사랑도 애순이 살아가는데 숨은 버팀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관식과 애순은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고 금명은 서울대학 합격증을 내밉니다. 애순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서울대 입학식에서 관식은 금명에게 관심을 갖는 남자애를 보고는 긴장을 합니다.
애순은 좁디좁은 반지하에서 사는 금명이 안쓰러워 양배추 밭을 팔았으면 하고 관식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관식은 그건 애순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들이 고달팠지만 좋았노라며 회상하며 걷는 관식과 애순은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서툴고 아팠던 그때를 그들의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기도 좋았다고 기억합니다.
2. 나레이션 & 명대사
애순이 넋을 잃고 차가운 동명의 시신을 안고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관식이 할 말을 잃고 주저앉으며 울 금명의 나레이션, "그들의 하늘이 무너지던 날, 처음으로 무쇠가 무너졌다. 아비의 울음은 파도를 덮었다."
슬픔에 지쳐 누워 잠시 잠든 애순은 꿈속에서 광례의 말을 기억해 냅니다. "살다가 똑 죽겠는 날이 오거든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을 쳐. '나는 안 죽어. 죽어도 살고야 만다'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꺼먼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금명과 은명이 동명의 죽음이 자신들의 탓이라 말하며 울 때 하던 금명의 나레이션, " 엄마 아빠는 그때, 정신이 번쩍 났다고 했다. 사흘을 누워 있던 무쇠가 일어났다. 그 고봉밥을 다 먹고는 그저 바다로 나갔다. 그들이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은 사흘, 단 사흘이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변덕스러운 여름의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 나오던 나레이션, "여름의 두 얼굴에 내 어린 부모는 속절없이 쓰러졌다. 태풍에 쓰러진 풀처럼 그렇게 눕고 또 일어났다."
중간에 이어지는 관식의 대사입니다. "그래도 여름 변덕에 또 살아져. 여름 태풍에 다 넘어간 풀이니 나무니 기어코 일어나는 거 봐. 다 쓰러 죽인다고 퍼부었다가도 땡볕 꽈랑꽈랑 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살려내. 산천도 다 벌떡 살려내."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다가 주저앉아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관식의 모습 위로 애순의 대사가 입혀집니다. "자식 앞세운 속을 말해 뭐 해. 내놓고 울지도 못하는 속이야. 진작에 간장이 다 녹았지."
은명의 밥을 챙겨주러 부엌에 들어간 애순이 이웃에서 가져다 놓은 여러 음식들을 보며 울 때 애순이 금명에게 했던 대사입니다. "어떻게 살랑가 싶더니 때마다 입 속에 밥술 떠 먹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살아지더라.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떼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이어지는 금명의 나레이션, "원래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금명의 서울살이를 위해 양배추 밭을 팔까 물어보는 애순에게 하던 관식의 대사, "그래도 양배추 밭은 냅둬. 그거는 자네가 그 여름 다 살아 낸 값이니까." 애순, "참, 어떻게 살까 싶더니만 진짜로 살민 살아졌네. 살민 살아졌어."
3. 삽입곡과 가사
# 뚜럼 박순동의 "고찌 글라"(도동리 만물센터 할머니가 애순에게 해주시던 말, 제주의 노래가사임)
| 제주어 가사 | 표준어 가사 |
| 고찌 글라(고치 글라) | 같이 가자 |
| 느영 고찌 글민 지꺼짐이 열배여 | 너와 함께 하면 즐거움이 열배야. |
| 고찌 글라 고찌 가게 | 같이 가자. 함께 가자. |
| 느영 고찌 글민 지꺼짐이 백배여 | 너와 함께 하면 즐거움이 백배야. |
| 영도 곱닥헌 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 이렇게 아름다운 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
| 느영 나영 고찌 글민 무신 걱정시냐 | 너와 내가 함께 하니 무슨 걱정 있으랴. |
| 고찌 글라 고찌 가게 | 같이 가자. 함께 가자. |
| 하영 골민 존다니 | 많이 말하면 잔소리지. |
#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금명이 서울대학교 합격통지서를 내밀 때 애순이 좋아하는 장면부터 입학식까지)
# 곽진언의 "이름"(마지막 장면에서 중년 애순이 금명에게 그 치열했던 여름날을 회상하며 나온 노래)
4. 낱말 이해하기
| 낱말 | 뜻 |
| 감태 | 전복의 먹이. 해조류 |
| 살민 | 살면 |
| 격질 | 식도가 좁아져서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여 구토가 자꾸 나는 병 |
| 구문쟁이 | 능성어의 제주방언 |
| 물꾸럭 | 문어의 제주방언 |
얄궂은 인생도 살면 살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버텨왔는지 조차 모르게 말입니다. 모두가 현재라는 시간선 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든 살아내고 있든 그 어디에도 혼자서는 버틸 구석이란 없는 듯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크던 작던, 내 주변의 손길들이 내 몫을 살아가는, 살아내는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늦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애순이 부엌에 들어가서야 은명이 달고나가 아닌 밥도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